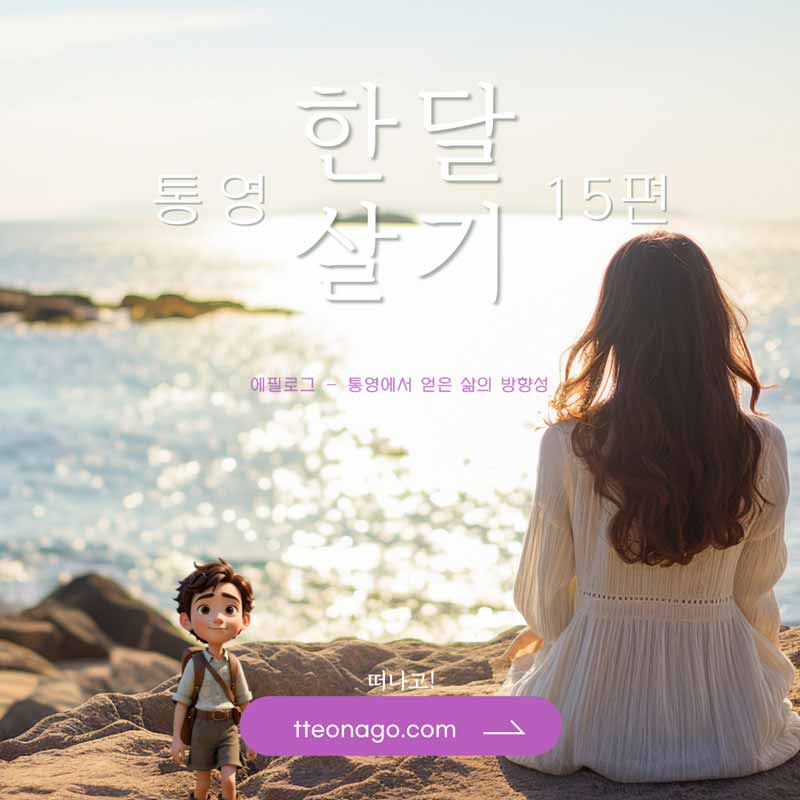
[통영 한달살기 15편]
에필로그: 바다 도시에서의 한 달, 그 이후의 삶
한 달 전, 통영으로 향하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바다를 마주하겠다는 설렘,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뒤섞였던 출발의 순간.
그리고 지금, 한 달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짐을 다시 싼다.
이 한 달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다.
자연이 마음을 다독인다
통영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는 일상,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작은 골목을 산책하며
마치 오랜 고향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는 마음을 천천히 덜어냈다.
산호빛 바다, 조용한 어촌마을, 거제도와 남해로 향하는 느린 이동이
내 안의 복잡함을 정리해주었다.
서울에서는 시간에 쫓기듯 살았다면,
통영에서는 시간과 손을 잡고 걸었다.
가장 큰 변화, '속도의 전환'
바삐 달리기만 하던 삶의 속도에서
천천히 ‘멈춰 서는 법’을 배우게 됐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카페 창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어느덧 하루의 루틴이 되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삶의 속도를 바꾸기엔 충분했다.
“언제 또 이런 여유를 느껴보겠어?”라는 마음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로 바뀌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
한달살기 중 만난 현지 사람들과의 인연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장 아주머니의 웃음, 카페 사장님의 커피 추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머문 이들과의 짧은 대화들.
관광객이 아닌, ‘살아가는 사람’으로 통영에 머물렀기에
더 따뜻하고 가까운 연결이 가능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돈다.
돌아간 후의 일상도 달라지길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식사는 좀 더 건강하게
-
하루의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
주말에는 익숙한 골목 대신 낯선 동네로 나서보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실천해보고 싶다.
한 달 동안 통영에 산 것이 아니라,
통영에서 '사는 법'을 다시 배운 시간이었다.
통영 한달살기를 마무리하며
이 시리즈를 읽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한 달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낯선 바닷마을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부드럽게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통영은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언제든 다시 찾아와 줄 준비가 되어 있다.